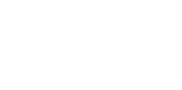[특별기고] 거룩한 유해 보며 성인의 굳센 믿음과 덕행을 기억·공경해야
- 작성일2022/07/14 02:20
- 조회 4,955
출처 : 가톨릭평화신문 | 2022.07.10 발행 [1670호] | 기사원문보기
[특별기고] 성인 유해 공경 유래와 의미 / 조한건 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순교자 유해 공경의 시작
흔히 인간학에서는 인간(人間)이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단일체”로 정의되고 있다. 전자는 보이는 것이고, 후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보이는 육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유물론(唯物論)으로 흐르게 되고, 영혼만을 강조하게 되면 유신론(唯神論)으로 기울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지상 생활 동안에는 물질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유물론적 무신론과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나온다.
사람이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과 같은 무덤, 고대 이집트의 미라, 중국의 병마용(兵馬俑),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왕릉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죽은 이들의 시신을 매장하거나 오래도록 보존하려는 노력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반 역사와 비교해보면 가톨릭교회의 성인 유해 공경은 또 다른 차원의 육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초기의 로마 박해시기부터 순교자들의 유해를 공경해왔다. 순교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박해시대가 지난 후에는 순교자들 대신 고행을 하던 수도자들이 영적인 순교라는 의미에서 순교자를 대신하였다. 신자들은 순교자들과 유명한 수도자들의 시신을 소중히 모셨고, 그 무덤 위에 성당이나 제대를 지었다.
성인들의 유해 위에 제대와 성당을 짓는 것은 바로 성인들의 무덤과 유해가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통은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대로 도입되었다. 1790년 북경 주교 구베아를 만나러 간 윤유일 바오로와 우 요한 세례자는 나중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미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성작, 미사 경본, 성석(聖石), 제의 등을 미리 받아 왔고 심지어 포도로 술을 만드는 법까지 배워왔다. 이 가운데 성석은 바로 옛날 제대에 반드시 놓아야 했던 성인의 유해가 들어 있는 네모진 돌을 가리킨다. 주문모 신부가 1795년 계동(桂洞) 최인길의 집에서 전라도 고산(高山)으로 피신할 때, 윤지충과 권상연의 무덤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주문모 신부는 “(이들이) 성인품에 이르게 되면, 마땅히 천주당을 그 사람의 무덤 위에 세워야 합니다. 훗날 조선에 천주교가 크게 행해지면, 이 두 사람의 무덤은 천주당 안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사학징의」 중에서) 바로 작년에 세 복자의 무덤이 발굴된 초남이 성지 ‘바우배기’를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다. 미사를 봉헌하던 옛 제대에는 항상 성인들의 유해를 모신 성석(聖石)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양업 신부도 스승께 청하여 성인의 유해를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옛 신자들은 늘 성인들의 유해를 모시고 미사를 봉헌했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이처럼 성인들의 유해를 곁에 모시고 공경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전통과 전례적 규정에 따라 성인들의 유해가 자연스럽게 분배되었는데, 한국 천주교회에도 1925년 79위 시복식과 1984년 103위 시성식을 전후로 하여 성해(聖骸)가 분배되었다. 물론 이러한 성인 유해의 분배는 성인 공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본당이나 사제, 수도자 등 책임자에게 보내졌다. 그런데 최근에 김대건 성인의 유해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풀어가 보자.
사도좌의 허가 없이 양도될 수 없어
유해에 대해서는 교회법 제1190조에 명확히 나와 있다. 1항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 2항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
즉 교회법에 따르면 위의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스캔들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최근 2017년에 발표된 시성성 훈령인 「교회의 유해 : 진정성과 보존」에서는 “성인과 복자의 유해는, 그 진정성을 보장하는 교회 권위의 유해 증명서가 없으면,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전시될 수 없다”(서론)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5조에서 다시 한 번 “거룩하지 않은 장소나 인가되지 않은 장소의 유해 전시는 물론 유해의 판매(곧 유해의 물물교환이나 매매)와 거래(곧 가격을 고려한 유해의 소유권 양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서울대교구에서는 작년 김대건 탄생 200주년 희년을 지내면서, 교구 내에 분배된 성인들의 유해를 조사하여 유해증명서가 없을 경우, 확인하여 재발급을 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어쩌면 위의 사건도 바로 그러한 과정 중에 벌어진 것이기에, 오히려 지금까지 성인 유해에 대한 교회의 관리가 부족했다면, 이를 계기로 새 지침에 맞갖게, 그리고 올바른 성인 공경을 하기 위해서도 성인의 유품과 유해를 잘 보존해야 하겠다. 또한, 새 지침 24조에는 “중요한 유해의 수습을 위해 주교가 시성성의 동의를 얻을 때를 제외하고 시신의 분해는 허가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성인 유해 공경의 참된 의미는
이제 다시 성인 유해 공경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자.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육신과 함께 하느님께서 부여해주시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영혼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천사적 능력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소멸되지 않는 자립성과 고유성을 가진다. 만일 이 영혼이 없다면 사람도 다른 짐승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사람의 혼은 육신에 붙어서 그 사람에게 기운을 주는 능력을 준다고 보았다. 육신이 죽으면 그 기운은 떨어져 나가 혼(魂)이 되어 날아가고, 육체는 백(魄)이 되어 썩어진다. 혼은 제사를 모실 때만 잠시 왔다가 결국에는 흩어져 무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조선 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제사가 가능한 것은 바로 그 혼이 잠시 동안이라고 신주(神主)에 머물고 깃들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결국 없어지고 말 유교의 혼 대신 각 사람에게 고유하며 사멸하지 않는 영혼(anima)으로 대치하고자 했다. 영혼이 살아있기에 성인들의 유해는 육신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미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전구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유해 공경의 진정한 의미는 그 유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유해를 도구로 하여 성인이 보여준 모범된 삶과 신앙과 덕행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해가 없는 무명 순교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인 유해를 공경하는 진정한 의미는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선행을 베풀고, 금욕하고, 고문을 견디며, 순교를 향해 나아갔던 성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유해들이 온전히 모셔지고 공경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하겠다. 이제 옛사람들이 왜 그토록 성인들의 유해를 곁에 모시고 싶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인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서도 주님의 것(로마 14,8)이기에, 성인의 육신만 있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살아 있는 것만 같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성해는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신덕(信德)과 용덕(勇德)과 선행을 느끼게 해준다.
한국의 순교 성인과 복자들을 생각하면 두 가지 온전한 신앙을 떠올리게 된다. 자신을 낳아주신 분을 대군대부(大君大父)라 부르며 믿었던 창조주에 대한 신앙고백과 그 창조주가 부여해 준 각자의 영혼이 천사처럼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다. 성인의 유해는 그러한 믿음을 자신의 몸에 녹여 살아갔던 이들이기에 우리도 그들을 통해 전구할 수 있다. 성인의 유해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되뇐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